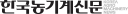작물이 내 발걸음 소리를 듣고싶어한다고?
“작물은 농민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은 참말이다. 수백수천 번 농민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정성스런 보살핌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우리가 먹는 달콤한 과일, 싱싱한 채소, 맛있는 쌀을 우리에게 되돌려준다. 그만큼 작물을 키우는 농민의 애정이 들어가야 작물이 잘 자란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농민은 경험이 늘어가고, 그 경험에 근거해서 더 많은 소득을 냈다. 그러나 지금은 발걸음 소리를 들려줄 농민이 많지 않다. 전 국민의 4.3%에 해당하는 210만 농민들은 65세 이상이 46.8%차지하고 있고, 이마저도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존 농업 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 1,293만원에 견줘 26.8% 감소했다. 이는 2012년 913만원 이후 10년만에 최저다. 일년내내 땀 흘려 지은 농사의 대가가 고작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더 암울한 전망치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년후 한국농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 농민 52.5%, 도시민 22%가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렇게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농업농촌이 겪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응답자의 61.5%가 농업인력의 부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향하는 농업정책의 방향은 명확하다.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농 증가 등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과, 이상기후와 탄소중립에 대응해서 환경과 조화로운 농업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는 활기찬 농촌을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농업인 소득을 올리는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정목표인‘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구현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DNA(Data, Network, 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한 스마트농업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농민의 경험에 의존하는 농사가 아닌, 현재의 작물생육상태와 기상 데이터, 토양 데이터 등을 근거로 편하게 농사짓는 것이 스마트농업이다. 농사짓는 사람이 줄고, 고령화된 현 시대에는 스마트농업이 유일한 대안이다.
스마트농업을 농업 전 분야로 확대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농업로봇을 활용하는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대응하고,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수와 수출시장으로 구분하여 소비자 선호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 농업인구 감소, 농촌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청년이 살고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청년농업인 정책이 필요하다.
작물이 좋아한다면, 기꺼이 내 발걸음 소리를 들려줘야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와 식량 문제, 지역소멸과 같은 농업·농촌 현안에 대응하는 스마트농업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농업은 생산성과 편의성,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분석에 따르면 토마토의 경우 상위 20% 농가의 생산량은 3.3㎡당 122.8㎏인 반면, 하위 20%는 52.3㎏로 큰 차이가 있다. 기술수준에 따라 농가 간 생산량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농업기술이다.
인공지능이 농가에서 수집한 온실 환경 데이터와 작물생육 데이터를 분석한 후 재배시기와 생육상황에 맞는 환경설정을 제시해줄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농업은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업 전 분야의 데이터를 디지털 형식으로 수집, 저장관리, 결합, 분석 및 공유하면서 영농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이다. 농업인의 경험과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을 딥러닝(심화학습)과 인공지능 기술이 대체하는 것이다. 스마트농업은 생산단계에서 센서, GPS, 드론, 영상판독 등의 기술을 적용해 자원의 최적화, 환경부담 최소화, 비용절감을 통한 경제성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농민의 발걸음을 대신한다. 더 나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즉, 플랫폼으로 농업데이터가 수집되고, 플랫폼 상에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농업은 단순히 농업의 생산성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전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 자원사용의 최적화 등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농업이다. 이 과정이 작물에게 농민의 정성을 보여준다.
산업간의 경계가 무너진 빅 블러 시대, 뭐든 가져다 쓰면 된다
‘블러(blur)’는 ‘희미한 것’ 또는 ‘흐릿해지다’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앞에 ‘크다’는 뜻의 big을 붙여 ‘big blur’로 종종 쓰는데, 이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 국방부에서 폭격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개발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지금은 거의 모든 자동차와 트랙터에서 사용하고 있다. 드론(Drone)도 마찬가지다. 제1차 세계대전 중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은 지금 농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에는 상추, 고추, 수박을 생산하는 식물공장이 있다. 이 식물공장 기술은 처음에는 우주산업에서 시작됐다.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에 지구에서 화성으로 유인우주선을 보내고, 그 우주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려면 26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화성으로 보내는 유인우주선에는 26개월 치의 식량을 싣고 가거나, 화성에서 26개월 동안 먹을 식량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시작된 연구가 식물공장연구이며, 지금은 작물이 자라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곳에서 많이 쓰고 있다. 이렇듯, 빅 블러 현상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비행태의 변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2023.6.30.)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스마트농업’을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이라고 정의했다. 정보통신기술과 4차산업혁명 기술 등을 농업에 활용한 새로운 농업방식인 ‘스마트농업’은 이렇게 출현했다. 빅 블러 시대를 맞아,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일이다.
여기에 챗GPT, 네이버의 HyperCLOVA X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분야에 활용하면 농업 대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진 빅 블러 시대, 어떤 분야의 기술이건 농업분야로 가져다 쓰면 된다. 예상치 못했던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초(超) 경쟁 시대를 열고 있다. 농업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 꼭 농민이 걸어가면서 내는 소리만 발걸음 소리가 아니다. 데이터를 읽고 이를 분석하는 것도 작물에게 발걸음 소리를 들려주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작물은 농민의 데이터 수집 소리를 듣고 자란다”